바뀔 수 있는 미래
모든 이미지: ⓒ 양경준 / 『못섬』 (사월의 눈, 2024)
바뀔 수 있는 미래
프롤로그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 들어가 지명을 입력해 봤습니다. '못섬'. 검색 결과에는 일치하는 장소는 나오지 않고, 목섬처럼 비슷한 이름의 장소 몇 곳만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못섬의 한자 지명 '지도(池島)'를 입력해 봅니다. 다행히 지도리로 행정구역이 표기된 작은 섬이 화면 가운데 뜹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포털에서 옛 이름만으로는 찾기조차 힘든 자그마한 섬입니다. 네모난 화면이 보여 주는 범위를 조금만 넓히면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단배처럼 보이지 않는 점으로 줄어듭니다.
저곳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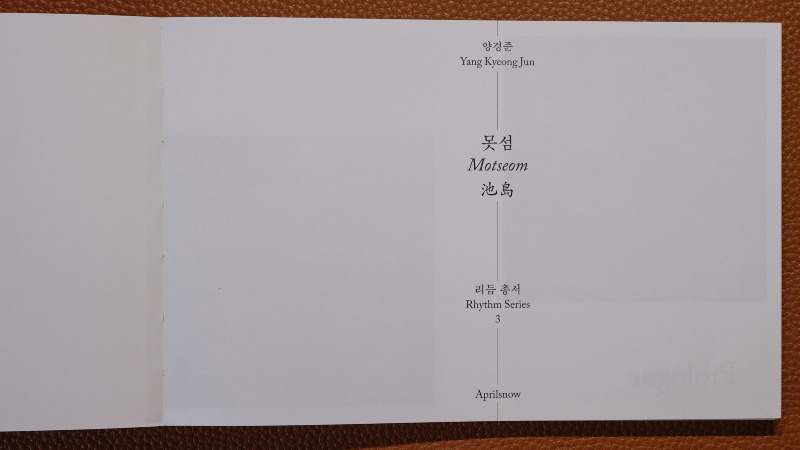
낱말
매일 저녁 뉴스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그 시작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몰라도, 당연하다는 듯 일기 예보가 맡고 있습니다. 채 몇 시간 남지 않은 내일 아침 날씨부터 며칠 뒤의 주말 날씨까지, 예보 덕분에 우리는 다가올 일기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운명을 먼저 알려 주는 일입니다.
'소멸'이란 낱말을 입안에서 곱씹습니다. 어쩐지 태곳적 두려움이 배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무지로 인해 세상 많은 일에 두려움을 품었던 석기시대의 원시인은 결국 소멸했습니다. 소멸은 사라지는 일입니다. 사라지는 건 잊히는 일이며, 잊히는 건 이윽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우리는 본능처럼 소멸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머리기사
소멸이 불러일으키는 공포가 종종 뉴스 머리기사를 장식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의 낮은 출생률에 경악했다는 소식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빈집이 늘어나며 몰락해 가는 지방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특집 기사까지 두려움 가득한 논조의 뉴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란 표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이, 마을이,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분석과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무엇도 그들의 소멸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소멸 예보
<소멸 예보>. 예보를 봤으니 대비해야 할 텐데, 그 미래가 소멸이라니 어찌할 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필멸자의 죽음 같은 운명을 암시하는 두 낱말의 조합은 사진작가 양경준이 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붙인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서쪽 바다 위의 외로운 땅, 못섬의 이야기를 사진과 글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현상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한 그는 키워드를 둘러싼 현상을 보고, 통계 자료를 찾아 읽고, 탐구하고, 해석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방향을 정리하고, 작업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민 10명이 채 되지 않는, 행정구역명으로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지도리를 부여받은 못섬이었습니다.
밤하늘 별빛이 실은 수만 년 전에 이미 사라졌을지 모를 별의 흔적이라면, 못섬은 오래 전 별처럼 사라지고 있는 이 땅 위의 터전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작가는 그곳을 찾았습니다. 시작은 통계와 데이터였지만, 손에 들고 있는 건 카메라였습니다.
한번 찾아가려면 마음먹고 휴가를 써야 할 정도로 외따로이 떠 있는 그곳에서 양경준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존재들
소멸이 예보된, 자신 앞에 놓인 슬픈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섬에는 자연과 동물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못섬의 땅, 못섬의 하늘과 바다, 못섬의 동물들과 사람들. 죽음을 품에 안은 <소멸 예보>에서 출발한 기록이 마주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살아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멸을 위해선 살아 숨 쉬는 것이 먼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궁금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 못섬에는 은숙이, 철호가, 승남과 기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염자와 염식이[^1]가 살고 있었고, 홀로 살던 주인을 잃은 개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백여 년 전까지 무인도였다는 못섬의 원래 주인들, 하늘과 바다와 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세월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물렀고, 앞으로 그만한 세월을 더 머무를 터입니다. 작가는 그러니 언젠가 못섬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0이 된다 한들, 이는 소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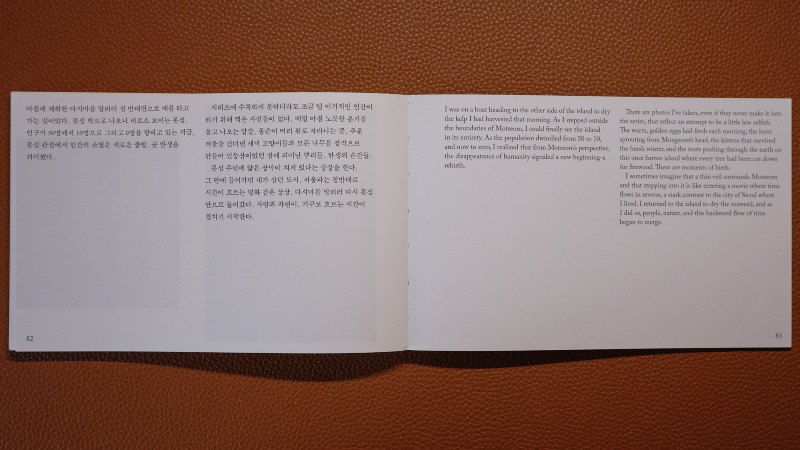
느릿하고, 차분하고, 포근한
양경준의 시선은 뭐라고 할까, 느릿하고, 차분하면서도 때로 포근합니다. 그는 대상을 향해 바삐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반 발짝 물러섰다가,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렇게 천천히 반 발짝씩, 반 발짝씩 앞을 향합니다. 아주머니의 미소에서는 첫 만남의 어색함이 지워졌습니다. 낯설었을 섬 안의 공간들도 왠지 익숙하게 보입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그러면서도 성기지 않게 쌓아 올린 관계의 힘이 사진가의 시선 안으로 녹아듭니다. 프레임 바깥 우리에게도 자연스레 그 힘이 전해집니다.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기록 방식은 작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정해진 답이 없게 마련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한 발짝씩 다가가려 하긴 어렵겠지요. 너무 친밀한 사이라면 오히려 조금 떨어져 담는 방법을 익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2] 양경준의 사진집 『못섬』(2024, 사월의 눈)은 섬에 어울리는 시선을 깨달았기에 담을 수 있던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마주하는 순간, 순간이 고요한 바다를 스쳐 가는 옅은 바람처럼 잔잔한 감정을 길어 올립니다.

에필로그
프로젝트의 시작은 통계를 비롯한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가의 눈을 거치며 종이에 적힌 수치에 불과하던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양경준의 이미지는 "은유와 직유, 변주"[^3]를 하며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문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한 자기만의 색깔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설과 암시를 자유롭게 오가며 '카메라라는 곡괭이로 캐낸'[^3] 사진들은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악보입니다.
잔잔한 감정 뒤편의 주제 의식은 묵직함을 넘어 슬픈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양경준의 예보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그가 우리 앞에 펼쳐 놓은 못섬과 또 다른 수많은 못섬들의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는 예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일까요?
일기 예보가 알려 주는 미래는 정교한 추측일 뿐입니다. 슈퍼컴퓨터와 최신 기법이 등장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개입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대기의 흐름입니다. 소멸이 예보된 무수한 못섬들 또한 다른 미래를 맞이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책이 무엇일지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일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진가[^4]의 기록이 우리에게 경보를 울리는, 그래서 함께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염자와 염식이는 엄마를 잃은 아기 염소 남매입니다. 안타깝게도 염식이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2]: 양경준 작가가 아버지를 담은 프로젝트를 보면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창작자의 작업 방식을 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 작가의 표현에서 따 왔습니다.
[^4]: 작가의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inside_jun/)과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omfortzone_lab)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일님의 댓글
이상일사진도 해설과 같이 보게되니 더 많은 의미를 갖고 볼 수 있어 좋네요